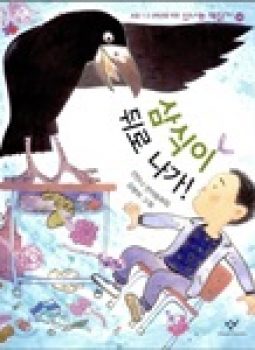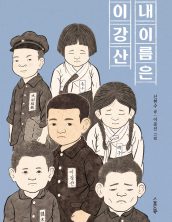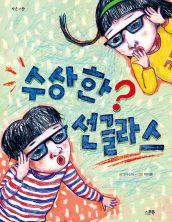호기심 많은 까마귀 가욱이는 종종 산 아랫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한다. 문제는 말썽쟁이 소년 삼식이가 가욱이만 보면 돌을 던진다는 것. 어느 날 가욱이는 폐교 위기에 처한 초롱꽃 분교가 ‘생태 과학 특성화 학교’를 꾸미려 한다는 것을 알고 새들의 학교 올빼미 교장선생님께 알린다.
올빼미 선생님은 한 알에 한 시간씩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마법의 열매를 먹고 초롱꽃 분교 교장 선생님과 면담해 학교 둘레 숲에 새집을 지어 새들이 자유롭게 보금자리를 트는 것으로 협의를 잘 마친다. 마법 열매를 한 알 얻어먹은 가욱이는 그 사이 빈 교실에서 “삼식이 뒤로 나가!” 하고 소리치고 삼식이 자리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놓는 것으로 분풀이를 하고는 기분 좋게 돌아온다.호기심 많은 까마귀 ‘가욱이’와 말썽쟁이 어린이 ‘삼식이’의 유머 넘치는 대결을 그린 연작동화집. 폐교 위기에 놓인 시골 분교를 살리려는 사람들과 거기 더불어 살고 있는 새들이 맞서고 협력하면서 각자의 세계를 지켜가는 이야기가 그려지는 가운데, 농사를 망치는 새로 오해 받아 억울한 까마귀와 새를 미워하는 어린이의 팽팽한 대결이 웃음을 자아낸다. 사람과 새, 어느 한쪽이 무조건 희생하기보다 각자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동화다.
저학년 동화의 모범이 될 만한 빼어난 의인동화
『삼식이 뒤로 나가!』는 산 아랫마을 사람들과 새들이 맞서고 협력하면서 공생하는 이야기를 까마귀 가욱이의 입장에서 풀어가는 의인동화다. 노련한 중견작가 선안나는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할 다양한 캐릭터를 생생하게 그려내 단박에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소 야단스럽지만 익살맞고 순진한 까마귀 가욱이, 현명한 올빼미 교장, 수다스러운 직박구리 빼옥이네 자매 등은 실제 동물의 이미지와 잘 맞게 의인화 되어 실감이 넘친다. 가욱이를 괴롭히는 코흘리개 말썽쟁이 삼식이도 집안을 걱정하는 의젓한 면이 있어 미워할 수가 없다. 아이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마을을 걱정하는 시골 분교 교사들의 성품도 따뜻하게 그려져 독자를 푸근하게 한다.
그리고 농사를 망치는 새로 오해 받아 억울한 까마귀와 새를 미워하는 어린이의 대결 구도는 단순하고 흥미로워서 저학년 어린이들도 쉽게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여차 저차 하여 저차 여차 했다”는 가욱이의 설명에 “가욱이가 자세히 알아보고 왔구나. 아주 잘했다.” 하고 교장이 답하는 장면이나, 어린 새들이 바글거리는 딱따구리 선생의 ‘벌레 잡는 법’ 수업, 인기 없는 재두루미 선생의 ‘새의 역사’ 수업 등 새들의 학교 묘사에서도 불필요한 수사 없이 쉬운 말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가의 빼어난 역량이 돋보인다. 여기에 시골 학교와 새들의 다양한 모습을 정감 있게 그린 김병하의 그림은 어린이들의 독서를 한층 즐겁고 풍요롭게 해준다.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모색하는 동화
『삼식이 뒤로 나가!』의 미덕 중 하나는 의인동화가 범하기 쉬운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첫 이야기 「삼식이 뒤로 나가!」에서 가욱이는 산 아랫마을 초롱꽃 분교가 폐교 위기를 벗어날 묘책으로 '생태 과학 특성화 학교'를 구상하고 그것을 위해 야생동물들을 잡아 기를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란다. 동물들로서는 "생태인지 동태인지 하는 학교" 때문에 때 아닌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 새들의 학교 올빼미 교장은 마법의 힘으로 잠시 사람 말을 써서 초롱꽃 분교장과 협의를 한다. 새를 잡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학교 둘레에 다양한 새장을 만들면 새들이 마음에 드는 집에 들어가 자유롭게 깃들이는 식으로 진정한 생태 학교를 꾸미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타지 사람들이 오가고, 서로 먹을거리를 나누는 장이 마련되면 새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데 두 교장이 뜻을 같이 한다.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라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투명 까마귀」에서 가욱이는 평소에 늘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삼식이가 새들 때문에 농사를 망쳐 온가족 시름이 깊은 탓에 새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새들은 먹고살기 위해 농작물을 따 먹지만, 사람들은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다. 「마법 열매 안내서」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새들이 주워 먹는 콩에 독을 넣는 사람도 생겨난다. 올빼미 교장은 다시 중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는 콩에 독을 넣지 말기를 부탁하고, 새들에게는 사람들의 콩을 먹더라도 "세 알 중에 한 알만" 먹으라고 당부한다. 이처럼 이 동화는 손쉬운 결론을 주기보다 독자가 사람과 자연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헤아리도록 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베풀지 않고 서로의 요구는 조정해가되 각자 자존심은 지키도록 한다. "사람들의 일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지"라는 올빼미 교장의 말은 다소 냉정하게 들리지만, 어쭙잖게 서로 이해한다고 하기보다 자연과 인간이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공생(共生)의 길을 찾기를 바라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기답게 힘찬”(「작가의 말」) 세상을 이 동화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