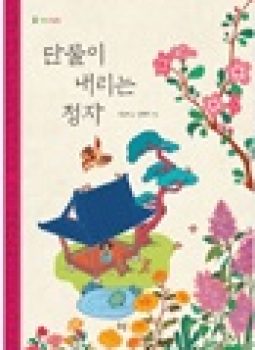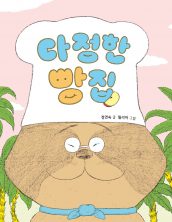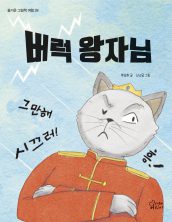임진왜란과 인조반정을 거치며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지나온 유몽인의 삶과 철학,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그려낸 독특한 민화풍의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민중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지역 설화,
따뜻하고 유쾌한 감동을 선사하는 그림책으로 탄생하다!
전라남도 고흥읍 남양면 월정리 설화
병어 공주와 대구 왕자의 좌충우돌 혼담 소동
민중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지역 설화,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감동을 선사하는 그림책으로 탄생하다!
동서양의 다양한 옛이야기를 발굴해 그림책으로 재구성한 새싹그림책 시리즈, 고흥 지역 설화 편. 《단물이 내리는 정자》는 조선 중기의 문장가인 유몽인이 고향인 전라남도 고흥읍 호동마을에 은거할 당시 머무른 정자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입니다. 임진왜란과 인조반정을 거치며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지나온 유몽인의 삶과 철학,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그려낸 독특한 민화풍의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파란만장 격동의 역사를 버텨낸 지식인
조선 중기의 문장가, 어우당 유몽인(柳夢寅, 1559년-1623년)은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지만 이후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23세의 나이로 소과에 합격하고, 30세에는 증광시에 장원으로 급제하는 등 순조롭게 출세의 길에 들어서는 듯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유몽인은 몽진하는 선조를 호종하고 명과의 외교 업무를 맡으며 세자를 중심으로 한 분조(임시 조정)의 일을 거들기도 하는 등 분주히 전란을 수습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명나라를 오가며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광해군이 다스리던 시기까지 전란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수습하며 적지 않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목대비의 폐비문제와 함께 정치 세력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자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유몽인에 대한 집권 세력의 공격이 거세졌고, 유몽인은 벼슬을 버린 채 유랑과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중들의 이야기를 글로 담다
와우산과 도봉산, 금강산 일대를 떠돌던 유몽인은 본관인 전라남도 고흥으로 내려가 1년 6개월가량을 머무르게 되는데, 《단물이 내리는 정자》는 유몽인이 고흥에 머물렀던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우당 대감은 자신이 머무르던 곳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그곳에 어울리는 고즈넉한 정자 한 채를 짓고는, 마을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와서 쉬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너그러운 대감을 모두 존경하고 좋아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자 주변의 정원을 산책하고, 마을 아이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일이 어우당 대감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어우당 대감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즐겨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온갖 신기하고 재미있는 야담들을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들을 밤새 글로 지어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 야담 문학의 효시로 민중의 애환을 담은 설화 문학으로 널리 알려진 《어우야담》은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운 정취를 품은 곳, 감로정
하지만 어우당 영감은 어쩐 일인지 정자의 이름을 쉬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어우당 영감의 정원에 몰려와 놀던 마을 아이들이 정원의 풀과 배롱나무에 맺힌 이슬을 맛보고는 그 맛이 꿀처럼 달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마을 사람들도 너도나도 대감의 정원에 찾아와 이슬을 맛보게 되고, 어우당 대감의 정원은 단 이슬이 맺히는 신기한 정원이라는 소문이 널리널리 퍼졌습니다. 어우당 대감은 마침내 ‘꿀과 같은 단 이슬이 내리는 정자’라 하여 ‘감로정甘露亭’이라는 이름을 지은 현판을 정자에 내걸게 됩니다. 조선 광해 때인 1612년 무렵 지어진 이 정자는 지금도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면 호동마을의 소택거리 북쪽 송현 고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목차